시간과 기억에 대한 낯선 감각들 - 프루스트를 기억하며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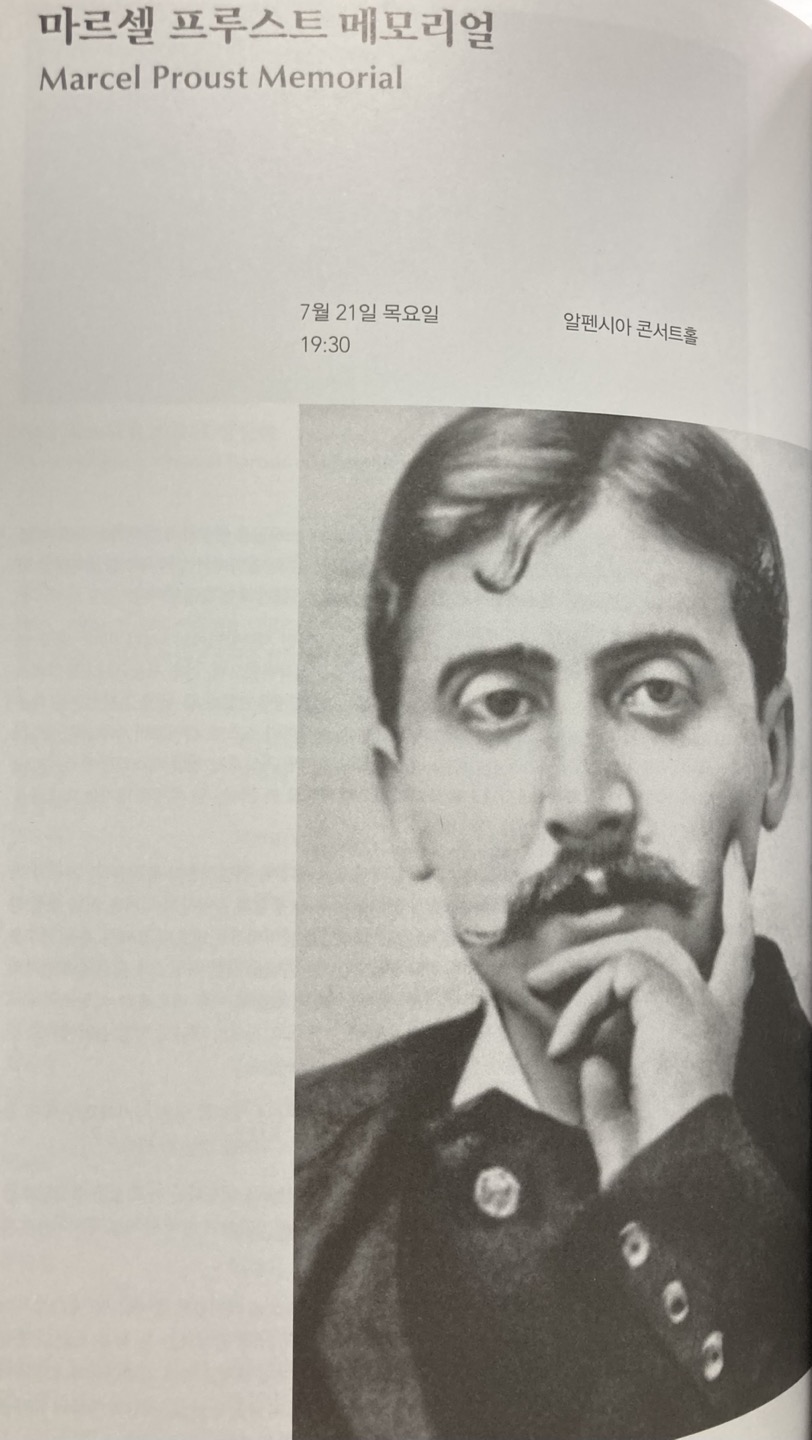
그레고리 베이트슨은 <마음의 생태학>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왜 외국어는 알 수 없는데, 몸짓과 목소리의 톤은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 그것은 언어는 디지털이고, 몸짓과 준언어는 아날로그이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언어란 0과 1로 이루어진 정보이자 지식이다. 야옹 야옹하며 울고, 혀로 자신의 온 몸을 치장하고, 어느 순간 어떻게 떨어져도 절대적인 신체 균형 감각으로 멋지게 착지하는 동물을 ‘고양이’라고 부르는 순간 지금 내가 아침 저녁으로 먹이를 주며 관계맺고 있는 ‘그’ 고양이는 사라진다. 고양이라는 언어레는 시간을 배제당한 정보만이 존재할 뿐이다.
반면에 인간인 내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은 고양이의 몸짓과 울음은 아날로그적인 면모 - 강도와 크기를 갖고 있다. 고양이는 명확한 언어로 “출출하니 먹을 것을 좀 주지 않겠나?”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야옹 야옹’거리는 소리와 몸짓에는 고양이 스스로가 감각하는 것을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것, 강도와 크기를 갖고 있는 ‘그것’이 있다. 절대 소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것’은 나에게 전달되고 해석되면서 비슷해보이는 ‘야옹’ 소리에 먹이를 주기도 하고, 물을 갖다 줄 때도, 아니면 머리를 쓰다듬어줄 때도 있다. 이런 해석 시간은 그 고양이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기억들, 지난 맥락들이 얼마나 쌓여 있는가에 따라 길어질수도 짧아질수도 있다. 프루스트는 4000페이지나 되는 소설을 통해서 디지털적인 언어에만 의지하지 말고, 아날로그적인 준언어와 언어가 가지고 있는 비언어적인 면모에 주목해하자고 말하고 있다.
디지털적인 시간과 기억에서 아날로그적 시간과 기억으로
프루스트는 소설 제목에서부터 이 책이 ‘시간’에 대한 이야기임을 말할 뿐 아니라 마지막 편의 제목을 ‘되찾은 시간’이라고 명명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한다. 프루스트가 보여주고자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시간과 기억에 관한 낯설게 되기를 시도하는 책이다.
똑같은 언어로밖에 표현할수밖에 없지만, 프루스트가 말하는 ‘시간’과 ‘기억’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시간과 기억과 전혀 다르다. 프루스트는 디지털적인 시간과 기억이 아니라 아날로그적인 시간과 기억에 대해 말하고 있다.
우리 머릿 속에 떠오르는 시간은 1년 365일 24시간의 객관적 시간이고, 기억이란 과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정보 저장이다. 하지만 객관적 시간이자 정보로서의 기억은 문자 발명 이후의 언어적 사고방식, 디지털적인 행동양식을 대변할 뿐이다. 사물과 생각을 언어로 표현 할 수 있으면서 다양하고 복잡한 생각들과 사물들을 발명할 수 있었다. 반대로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물 자체의 독특성과 관계성이 배제될 수밖에 없다.
점의 사고에서 선적인 사고로
강원도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것은 단순히 설악산, 경포대라는 점(dot)의 기억이 아니다. 물론, 설악산이라는 풍광과 좋은 공기가 주는 즐거움이 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느끼는 기쁨과 설렘 그리고 여행 이후 점점 더 선명해지는 추억은 점이 아닌 설악산과 경포대라는 지점으로 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신체에 축적된, 즉 선(line)의 기억이다.
1980년대에 수도권에서 강원도를 간다는 것은 진부령이나 대관령의 굽이 굽이 이어지는 산길을 넘어가는 과정이었고, 꽉 막힌 차 속에서 과자와 찐계란을 먹는 것이었다. 지쳐서 차 속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퇴비 냄새에 창문을 닫기도 하고 갑작스레 등장하는 멋진 풍광이나 소나기에 놀라기도 했다. 몇 개 없던 휴게소에 들러서 엄청난 인파를 헤쳐서 화장실을 다녀오는 일까지. 바로 이런 과정 하나 하나를 거쳐서 지나갔을 때 설악산과 경포대의 기억은 내 신체에, 함께 갔던 가족이니 친구들의 신체에 깊숙히 새겨진다. 여행을 준비하고, 그곳을 가면서 보고 느낀 모든 사건들과 풍경들이 시간을 지나면서 내 신체에 차곡차곡 쌓인것, 그것이 바로 프루스트가 말하는 기억이다.
우리는 기억을 디지털 정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기억은 그 과정의 시간들이 고스란히 축적되어 다시 현재화되는 경험이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말이 있지만 어떻게 도착했는지 그 시간과 과정에 따라서 ‘기억’은 전혀 달라진다. 기억은 정보가 아니다. 기억은 그 과정의 시간을 포함하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형성되는 신체 상태이자 아날로그적 강도다. 마르셀이 홍차와 마들렌을 먹으면서 체험한 그 순간, 게르망트의 집안으로 들어서다가 포석에 부딪히면서 떠올리는 순간이 바로 디지털적인 기억이 아니라 아날로그적인 강도와 크기를 가진 기억이다.
지금은 서울에서 양양이나 강릉을 간다고 하더라도 2~3시간이면 도착한다. 모든 길에 터널을 뚫어놓았기에 대관령이나 진부령 산길을 넘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고, 중간 중간 멋지고 안락한 휴게소도 많다. 하지만 고속도로를 타고 수많은 터널을 지나다 보면 어디가 어딘지 분간하기도 쉽지 않다. 똑같은 고속도로 풍경과 똑같은 휴게소들. 이렇게 빨리 목표점에 도착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게 무엇일까? 시간을 아낀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 아낀 시간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걸까? 아무런 과정 없이, 노력 없이 목표점에 도달하고 맛있는 것만 쏙쏙 빼 먹으려고 하지만, 정작 그렇게 목표점에 도달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런 기쁨과 즐거움도 느끼지 못한다. 도리어 삶을 지루하게 느끼고 갖고 있던 삶의 동력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더 빨라진 자동차, 비행기, 과정을 단축시키는 기술이 정말로 좋은 것인지 생각해보게 된다.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들인다는 것은 미련한 짓이고, 능력이 없는 것이 되어 있는데 정작 우리가 진정으로 경험하려는 것들은 그러한 과정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 설탕과 물을 그대로 놓는다고 설탕물이 되지 않는다. 설탕과 물이 섞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프루스트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모두를 통과하며 빚어지는 나를 만나는 과정 - '꽃핀 소녀들의 그늘에서' 글쓰기 후기 (0) | 2023.01.19 |
|---|---|
| 모든 것은 빛난다 - 마르셀의 (자기)의식 변천사 (0) | 2023.01.19 |
| 프루스트를 기억하며 - Reynaldo Hahn “À Chloris” (0) | 2022.07.23 |
| 다시 읽을수록 빛을 발하는 책 - 게르망트쪽 (0) | 2022.07.19 |
| 귀족과 왕족이라는 다른 종의 세계에 입문하다 (0) | 2022.07.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