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리는 결코 미리 전제된 선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사유 안에서 행사된 폭력의 결과이다.
- 이것만큼 프루스트가 강조한 테마는 거의 없다. … 진리는 어떤 사물과의 마주침에 의존하는데, 이 마주침은 우리에게 사유하도록 강요하고 참된 것을 찾도록 강요한다. 마주침의 [속성인] 우연과 강요의 [속성인] 압력은 프루스트의 두 가지 근본적인 테마이다. 대상을 우연히 마주친 대상이게끔 하는 것, 우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 - 이것이 바로 기호이다.
사유된 것의 필연성을 보장하는 것은 마주침의 우연성이다.
질 들뢰즈 <프루스트와 기호들> 4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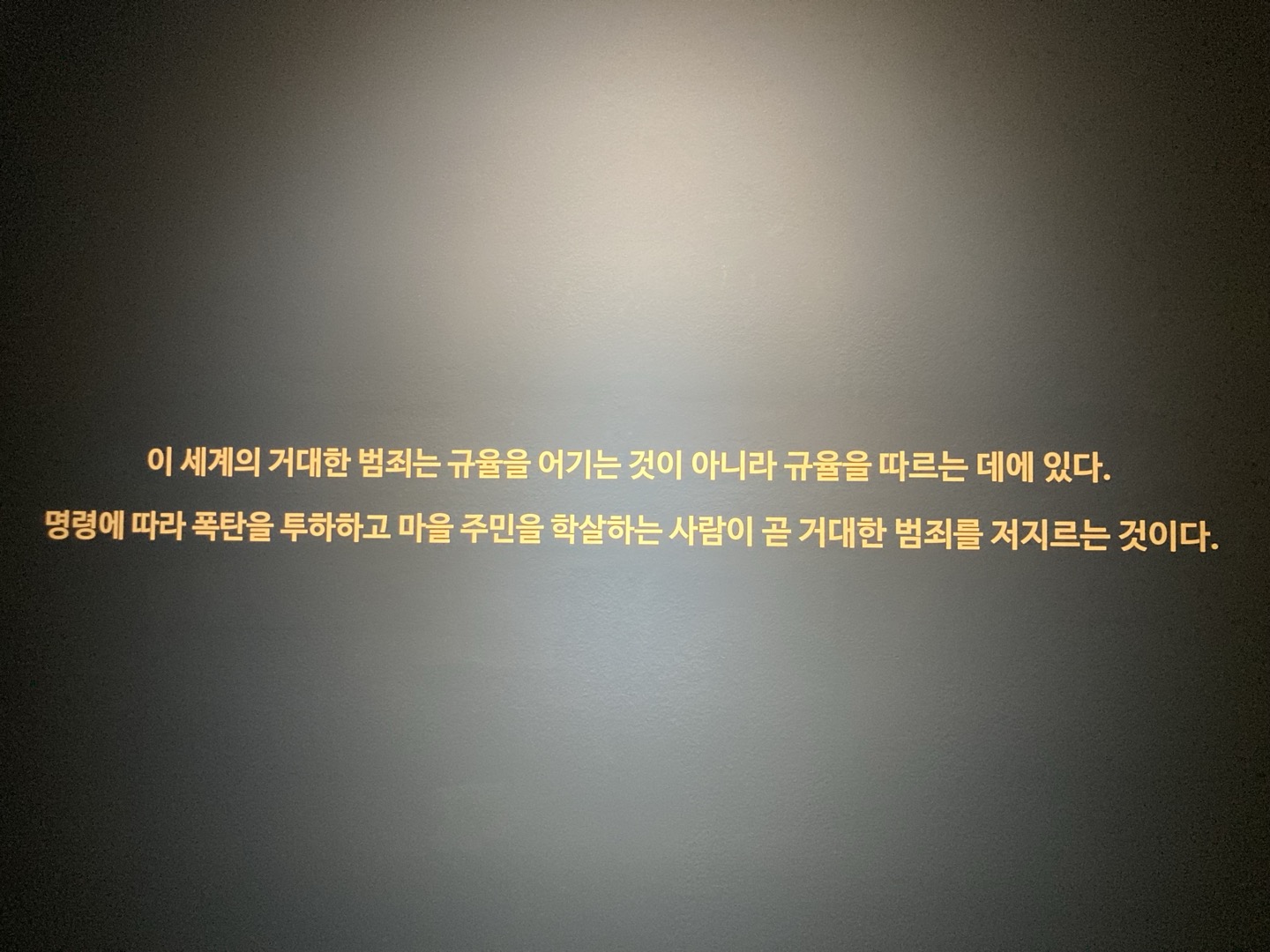
사유란 기호와의 우연한 마주침이자 폭력의 결과라는 것을 오늘 아침 새삼스럽게 경험했다.
새벽낭독을 함께 하고 있는 한 분이 후기를 쓰시면서 김영민샘의 <집중과 영혼>에 나오는 한 구절을 언급했다. 오랜만에 마주친 김영민이라는 이름에서 반가움을 느꼈고, '나 역시 김영민 샘의 글을 좋아한다'고 답글을 남겼다. 이렇게 답글을 남기고 나니 궁금해졌다. <집중과 영혼>을 펴서 한두 문장을 읽어봤다. 또 다시 <동무론>을 펴서 몇장을 읽었다. 요즘 김영민샘은 어떻게 공부하고 계신지 궁금했다. 인터넷에 '철학자 김영민'을 치고 최근 기사를 읽었다.
"공부 시작은 질투하지 않고 화를 참는 것부터"란 기사를 읽었다.
제목을 읽는 순간, 김영민샘의 몇몇 문장을 읽는 순간 명상중에 나를 내리치는 대나무가 느껴졌다. 아니 날선 단검이 머리 위에 서 있는 것 과 같은 서늘함을 느꼈다. 둥둥 떠다니던 몸뚱아리가 이제서야 다시 땅을 딛게 된 것 같았다.
새벽낭독을 하면서도 니체의 말이 잘 들어오지 않았다. 어딘가에서 인용하고 싶은 멋진 말들이 없어서일까. 니체를 읽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를 읽는 것이고 나를 알아가는 것인데 어떤 숙성도 없이 그저 니체만 처다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공부란 "머리통 속에 랑시에르나 장자 등을 쑤셔 넣어 지랄(知剌)을 떠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송곳처럼 몸을 뚫고 들어왔다. 요즘 나는 머리통 속에 니체 들뢰즈 해러웨이를 쑤셔 놓고 지랄하고 있었던 것. " '생각은 공부가 아니’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은 도무지 타인에게 닿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 "몸을 끄-을-고" 나아가는 일이 공부임을 잊고 있었던 것 같다.
뭔가 알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몸은 땅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 새벽낭독이 잘 읽히지 않았던 것, 들뢰즈의 말이 점점 미로처럼 보였던 것도 역시나 이런 이유였던것 같다. 타자의 입에서 우연하게 마주친 김영민이라는 기호가 행사한 폭력! 몸을 만드는 일에 좀 더 힘을 써야겠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좀 더 집중하면서 글을 벼려야할 것 같다.
다시 절실히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기다.
슈베르트의 기도 F. Schubert : Litanei, D.343
https://youtu.be/r_lKusBeO0A?si=ENmy7zBU5z7k3EoJ
'들뢰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소수적인' 문학과 소설의 종말 (0) | 2024.07.10 |
|---|---|
| [PS] 정말 예술의 기호는 다른 모든 기호들보다 우월한가? (4) | 2024.05.02 |
| [PS] 들뢰즈는 왜 '프루스트'와 '기호들'에 주목했을까 (0) | 2024.05.02 |
| [PS] - 비표상적 사유로의 탐색 (0) | 2024.05.02 |
| 세계 끝의 버섯 (0) | 2023.12.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