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셀 모스의 <증여론>
- 순수한 증여나 완전한 사리사욕은 없다 -
마르셀 모스는 폴리네시아, 멜라네시아 그리고 북서부 아메리카의 몇몇 부족 사회를 탐구하면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것으로만 여기지는 현재의 교환과는 다른 ‘증여-교환체계’를 소개한다. 그리고 모스는 증여-교환 체계가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기’라는 것으로 점철된 태고 사회 전체의 특징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는 태고사회의 특징을 ‘전체적인 급부체계’라고 부른다.
전체적인 급부체계는 ‘총체적 사회적 사실’이라는 개념으로 드러나는데, 모스는 ‘여러 사실들을 그것이 속해 있는 사회적 단위들의 총체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모스는 특히 멜라네시아의 부족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거대한 선물 교환 방식인 쿨라(kula)와 북서부 아메리카의 콰키우틀 족에서 적대적 경쟁과 과시적인 소비로 특징지어지는 포틀래치(potlatch)를 집중적으로 탐구했다. 모스가 보기에 쿨라와 포틀래치는 단순한 종교적, 경제적 행사가 아니라 그 사회 전체의 구성 메커니즘인 ‘주기-받기-답례하기’의 특수한 모습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최고의 선은 더 많은 재산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주는 것’이다. 하지만 최고의 ‘선’을 추구하는 것 역시 도덕적인 부분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도덕적일 뿐 아니라, 종교적, 경제적, 심미적 부분을 포함해서 그 사회 전체의 구성원리로 작동하고 있다. 즉 총체적 사회적 사실로써 쿨라, 포틀래치는 그들의 일상적인 삶을 지배하고 있는 다양한 동기들과 그 관리가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모습일 뿐이다.
그런데 경제적인 교환활동으로만 보이는 증여-교환체계는 어떻게 그 사회의 총체성을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한 사건을 볼 때 기계적으로 그것을 진/선/미의 관점으로 분해하여 바라본다. 또한 우리는 이런 분리 안에서도 ‘이성적인 사고’를 최고의 시선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바로 더 높은 계급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리된 사고’를 귀족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사건과 감정’이 서로 엮이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분리된 사고는 태고사회와 달라진 ‘합리성’ 혹은 ‘계산가능성’으로 나타나는 근대의 총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런 근대의 총체성 안에서 우리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속담처럼, 돈을 버는 활동과 그 돈을 사용하는 행위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는 것 같다. 사람들은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이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에는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조금 더 가까이에는 봉사 활동으로만 유명해지는 국내 연예인들의 예를 들 수 있다. 아무도 이들의 순수한 자선활동에 딴지를 걸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의 ‘자선’을 최고의 모범으로 사회에 던져주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길을 본받으려고 할 뿐이다. 사람들은 다만 ‘순수한 자선’으로 보여지는 행위 결과에만 관심을 보일 뿐이다. 즉 근대사회는 태고사회의 ‘전체적 급부체계’와 다른 총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분리된 사고를 가지고 모든 것을 계산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자본 만능의 총체성을.
하지만 돈을 버는 것(경제적 부분)과 돈을 쓰는 것(도덕적/종교적/심미적 부분) 사이에 이런 ‘분리’가 존재할 수 있을까? 어떤식으로든 많은 돈을 좋은 목적으로만 쓰면 되는 것일까. 국내에서 가장 많은 돈을 순수한 자선활동에 기부하고 있는 대기업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의 자선을 볼 때 그 기업이 행한 자선만큼의 비도덕적인 일들과 부정 혹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자선과 반대되는 면을 상상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모스는 근대의 총체성과는 다른 태고사회를 보여주면서 ‘지금과 다른’ 모습의 삶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또한 모스는 “자선은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는 더욱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의식적이며 모욕적인 후원을 없애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무언가를 갖고 싶다는 욕망을 부정할 수는 없다. 또한 완전하게 무사심(無私心)하고 싶은 욕구 역시 그러하지 않은가? 문제는 우리가 이런 욕망의 ‘혼재’를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이고, 자신의 욕망을 사안에 따라서 완전하게 분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에서 돈을 버는 나, 아버지로서의 나, 봉사 활동가로서의 나를 더욱더 철저히 구분하려고 한다. 이런 모습들이 서로 서로 교차되는 것은 프로가 아니라는 생각과 완전한 분리를 실현하려는 노력들이 삶을 살아가는 것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회사에서의 비정하고 비도덕적인 모습은 ‘순수한 자선’으로 상쇄될 수 있다고 여긴다. 여기엔 물론 완벽한 계산이 가능하다는 근대의 총체성이 전제된다. 우리는 어떤 사건이나 행위를 볼 때, 근대의 총체성 관점이 아니라 모스가 제안하고 있는 ‘전체적인 급부체계’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오랫동안 다른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근대 서구사회가 만들어 놓은 ‘경제적 동물’이라는 존재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누군가 콰키우틀족의 추장처럼 자신의 물건들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잔치를 열고, 가장 소중한 물건을 서슴치 않고 파괴해 버린다면 우리는 그것을 돈 있는 사람의 ‘허영’이나, 반대로 삶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겠는가?
다행인 것은 모스가 태고사회에서 발견한 ‘전체적인 급부체계’는 위에서 언급한 몇몇 부족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모스는 이런 모습이 오래된 문명인 로마, 힌두, 게르만 법에서도 존재했으며, 지금의 사회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그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태평양의 몇몇 부족들에게 있어 선물을 준다는 것은 관계 맺기의 시작이고, 이것은 친근함이면서 두려움이기도 하다. 물건의 인도에 법적인 구속이 따른다는 로마법의 넥숨(nexum)이나 게르만법에 나타난 gift의 이중적인 의미, 선물인 한편 독이라는 뜻은 이런 체계의 독특한 면을 잘 보여준다. 예전 어른들이 이사를 하게되면 떡을 돌리고, 떡은 받은 이웃들은 그 그릇 위에 더 많은 선물을 얹어 되돌려주는 관습 역시 이런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선물은 순수해야만 한다. 돈을 버는 것은 완전히 사리사욕적이다. 이런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막고 있는 장벽이 아닐까? 우리는 사회를 그리고 개인적 삶을 총체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잉여물이 발생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 잉여물로 인해서 더 고통받는 세상이 되어버린 사회에서 모스의 <증여론>은 다른 방식의 삶을 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다.
'철학 > 선물과증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또 다시 <증여론> (0) | 2021.01.25 |
|---|---|
| 증여 혹은 다른 종류의 유대 (0) | 2018.06.06 |
| [선물과증여] 석기시대 경제학 (0) | 2015.07.02 |
| [선물과증여] 선물을 되갚아야 하는 이유 (0) | 2015.06.12 |
| [선물과증여] 완변한 낭비로서의 증여 (0) | 2014.08.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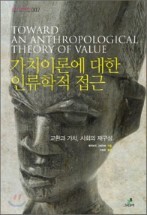





댓글